
부처님처럼 사는 다섯 가지 조건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비심을 갖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자비심에 대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막아주고
생각해주는 마음, 자비심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한없이 키우면 그것이 곧
행복을 가꾸는 길 중에 하나가 되는 따뜻한 미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나오는 보시가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끊임없이 남에게 베푸는 것은 곧 나에게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푸는 것은 부자로 사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훔치는 것은 가난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희생과 섬김으로 가난하게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그만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그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숙명론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불교가 숙명론이라면 중생은 중생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아귀는 아귀로, 수라는 수라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불을 마칠 때 ‘자타 일시 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라고 발원합니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부처의 종자를 얼마나 키우고 가꾸고 실천하느냐입니다.
세 번째는 맑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파종을 안 하고 추수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추수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맑은 생활을 원한다면 그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불교 계율에서 ‘게걸음 걷지 마라’는 것이
이 말뜻은 게걸음을 하면 가장 먼저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혹시 밖에 나가서 어쩌지 않나 하는 불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행복의 조건을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곤 합니다.
무조건 믿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화합하고, 무조건 참는 것.
이른바 ‘신애경 화인(信愛敬和忍)’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하면 한 덩어리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을 심고 맑게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입과 생각이 짓는 업을 통칭해 삼업(三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입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요즘을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신용이 좋은 사람은 믿고 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이때 신용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곧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는 아주 진실하고 신용 있는 사람이니 믿어달라’고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닌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진실은 광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수경에 ‘진실 어중선 밀어(眞實語中宣密語)’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아들딸이 아들딸 노릇을 잘해야 하듯이,
우리는 모두 불자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고,
꾸미는 말 하지 않고, 이간질이나 악담을 하지 않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말을 잘하는 데는 네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좋은 말만 하고,
둘째 이치에 맞는 말만 하고,
셋째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넷째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항상 진실하여 신용이 있고,
말 한마디에 천금의 무게를 가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사는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은 슬기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혜(智慧)’라고 합니다.
계율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밝은 지혜를 닦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처님처럼 사는 법
다섯 가지는 사실 불교의 오계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린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남의 목숨을 헤치지 않는 것[불살생(不殺生)],
복을 심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불투도(不偸盜)],
맑은 삶을 살아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불사음(不邪淫)],
진실한 언어생활을 하는 것[불 망어(不忘語)],
지혜를 키우는 것[불음주(不飮酒)]을
불교의 기본 계율에 결부시켜 비유한 것입니다.
행복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행복한 사람과 그 반대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복은 누군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또 외우기도 쉽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는 범부(중생)의 삶이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처님의 삶,
보살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입보리 행론」에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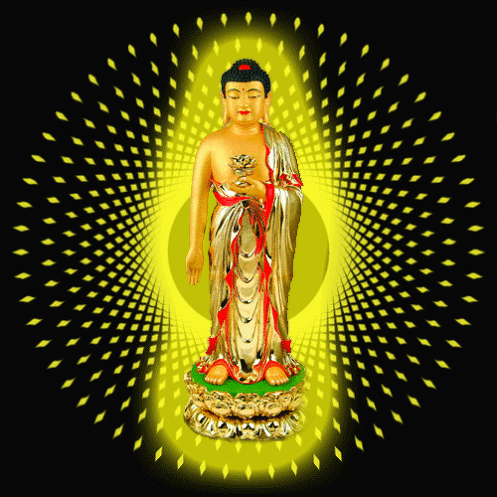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을 지어가며 살고 있습니까?
만물은 홀로 존재할 수 없어
인생은 만남과 인연의 연속입니다.
좋은 사람만을 만나서 선연(善緣)을 이어가고 싶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의 인연은 전생의 업력에 따라 생깁니다.
우리들은 ‘인연과 근기에 따라 산다’고 했듯이
자신의 근기도 훌륭해야 좋은 인연을 엮어갈 수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에서 인(因)이란 자기 인자
즉 자신의 근기이니 이것이 업이고,
연(緣)이란 여건이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연은 자신의 업과 주변 환경이 맞물려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인연을 잘 성찰해 보면
연기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고 하지 않았습까?
연기법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도 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지장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지장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대한민국도 지구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으며,
지구 역시 우주가 존재하기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 여러분과 나는 물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중무진의 인과 연이 맺어져서
현상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계에 사는 우리가 내 업대로만 살겠다면
그것처럼 우매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업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순간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윤회도 끊을 수 있다고 믿고 해탈을 향해 길을 떠나는 나그네
나그네는 자신의 악업을 소멸시키고 선업을 쌓아가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德)을 짓고
누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실천해 가야 하고
복은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인연이 좋아야 복덕을 안을 수 있는데
그 인연은 자신의 근기와 여건이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 개인은
자신의 근기도 돈독히 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노력의 실마리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정견은 그 견해란 눈으로 보는 것을 이르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어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6근이 작용하는데
정견을 가져야 이 6근을 조정할 수 있고,
정견을 가져야 6근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또한 정견이 확립되면 우리의 인생과 사회 우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정견을 세우면 정사와 정어, 정업, 정명, 정근, 정념, 정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다만 정정은 수행을 통해 가능한 것이니 만큼
큰 원력을 세워야 함을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삼매의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만큼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여러 사람과 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마음 곳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 (3) | 2023.01.06 |
|---|---|
| 누가 내것 만들어주는가을 바라지 말라 (2) | 2022.12.25 |
| 가피의 길 (6) | 2022.11.22 |
| 반야선 (2) | 2022.07.14 |
| 무지한 사람은 기도해도 복을 짓지 못 함 (1) | 2021.09.29 |



